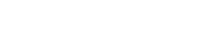‘갈등’을 ‘차이’로 ··· ‘화합’의 시작
페이지 정보
호수 309호 발행인 록경(황보상민) 발간일 2025-08-01 신문면수 16면 카테고리 연재 서브카테고리 역삼한담페이지 정보
필자명 탁상달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시인 필자정보 - 리라이터 -페이지 정보
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25-08-18 12:12 조회 912회본문
갈등(葛藤)은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혀 헤어날 수 없는 형상(形像)을 문자화한 한자 말이다.
칡(갈=葛)은 나무를 오른쪽으로 휘감아 돌아 오르고, 등나무(등=藤)는 나무를 왼쪽으로 휘감아 돌아 오르기 때문에, 서로 맞부딪치면 얽힐 수밖에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칡은 모습과 달리 인간에게 유익한 약재이다.
캐는 사람의 정성스러운 수고와 먹는 사람의 믿음이 조화를 이룰 때, 칡은 효능 있는 약재로서 훌륭하게 구실 하게 된다.
등나무는 등나무대로 벤치에 그늘을 만들어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넉넉함이 있고, 초여름 연자줏빛 꽃으로 색다른 정취를 자아낸다.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일 터. 서로 헐뜯고 다투며 생채기 내기에 몰입한다면 서로의 장점을 보완할 수 없고, 화합(和合)도 이룰 수 없다.
한순간만이라도 각자가 칡 캐는 이의 심성(心性)과 등나무의 후덕함을 닮아가려 한다면, 나와 너, 곧 우리 사이의 화합은 한결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화합은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좋아하는 만큼 아끼고, 예뻐하는 만큼 솔직하게 표현하여, 최소한 서로에게 생채기는 내지 말아야 한다.
상대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상대로부터 미움을 되사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바로 자신을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만드는 받침이 된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물(事物)을 바라보고, 상황을 통해 설득하는 타협(妥協)의 지혜(智慧)로 상대방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자.
지역(地域)이건, 계층(階層)이건, 세대(世代)이건 간에 ‘갈등’의 코드로 접근하는 한 영원히 화해는 존재할 수 없다.
‘갈등’을 ‘차이’로 바꿔 인식하는 것만이 화합의 씨앗이다.
‘차이’란 바로 나와 너의 다름을 인정하는 평화의 키워드이다.
‘틀린 그림 찾기’라는 게임이 있다. 비슷한 두 개의 그림에서 서로 다르게 그려진 부분을 찾아내는 퍼즐이다.
어떤 이는 ‘틀린 그림 찾기’라는 표현은 틀렸다고 이야기한다.
‘틀리다’는 ‘계산이 틀리다’와 같이 ‘옳지 않다’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평범한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에서는 ‘틀리다’보다 ‘다르다’라는 판단을 해야 할 경우가 더 많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성급한 단정에서 불화(不和)와 갈등이 시작된다.
‘다름’의 차이를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같은 물체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원뿔을, 한 사람은 위에서 보면서 동그랗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옆에서 보면서 세모라고 말한 것과 같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의 시각(視覺)으로 바라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상대방의 관점이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과 불신(不信)이 생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지 않고, 중간에 성급하게 끊으면 생각의 ‘다름’을 알 수가 없다.
피터 드러커는 “내가 만일 경청하는 습관을 갖지 못했다면, 나는 그 누구도 설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훌륭한 리더의 첫 번째 덕목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말이다.
<탈무드>에는 “사람에게 입[口]이 하나요, 귀[耳]가 둘인 이유는 듣기를 말하기의 두 배로 하라는 뜻”이라는 말이 있다.
말 많고 갈등 심한 세상, 귀담아 듣고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는 일만 잘하여도 훨씬 조용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