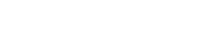비슬산 용연사 보양 선사
페이지 정보
호수 309호 발행인 록경(황보상민) 발간일 2025-08-01 신문면수 14면 카테고리 밀교 서브카테고리 밀교법장담론페이지 정보
필자명 정성준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자유기고가 필자정보 - 리라이터 -페이지 정보
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25-08-18 12:00 조회 895회본문
용연사는 동화사(桐華寺)의 말사로 신라 하대에 창건되었으며, 15세기 이후 중창됐으나 임진왜란 때 화재로 소실되고 다시 재건을 반복했다. 용연사는 통도사의 사리가 옮겨 오면서 금강계단이 조성된 것으로 유명하다. <조선사찰사료> 경상북도 편에 ‘용연사 중수비 서문[龍淵寺重修碑序]’이 전한다. 승지에 올랐던 임수간(任守幹, 1665~1721)이 지은 글에는 용연사가 소재한 달성지역 비슬산(毗瑟山)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일부를 인용하면, “달성(達城, 현 대구) 남쪽 30리 거리에 비슬(琵瑟)이라는 산이 있으니 소슬(所瑟)이라고도 하는데 산스끄리뜨어로 ‘포(苞)’라고 한다. 신라 시대에 동쪽에서 온 천축 승려가 구경하고서 이름을 붙인 것으로, ‘비야(毗耶)’나 ‘지제(支提)’와 같은 말이지만 지금 상고할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 ‘비슬’의 산스끄리뜨 원어는 확인할 수 없지만, 문맥은 ‘숲이 덮인 동산’ 정도로 파악하는 것 같다. 비야는 불전에 나오는 비야리성, 지제는 불탑의 형식 가운데 하나인 짜이드야(Caitya)를 가리키는 말인데, 필자 생각에는 비슬과 유사한 원어는 ‘순수’, 혹은 ‘적정’에 해당하는 비슈디(Vishuddhi)와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공통점은 수행처에서 유추한 말이라는 점이다.
이어지는 비문에는, “또한 산의 동쪽에는 용연사(龍淵寺)라는 절이 있는데 골짜기에 신령한 용의 굴이 있었기에 이름을 지은 것이다. 혹은 신라의 보양 선사(寶壤 禪師)가 중국에 들어가 종남산(終南山) 지암 대사(智巖 大師)에게서 법을 증득하고 돌아올 때 서해 용왕이 인보(印寶)를 받들었으므로 신인종(神印宗)이라 칭하였으니 동방 법문(法門)의 시조가 된다. 빼어난 땅을 골라 뽑아 용연사를 창건했다고 하는데, 그 뒤를 이어 폐해졌다가 일어났으므로 전적이 사라져서 고증할 수 없으니 탄식할 만하다”라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삼국유사> ‘보양리목(寶壤利木)’ 조(條)에 나온 것인데, 같은 조 다른 기록에는 보양 선사를 조사 지식(知識)이라 하였으며, 이어 “신라 말의 승려로 중국 당나라에 가서 법을 전수받고 돌아오다 용궁에서 금라가사(金羅袈娑)를 선물 받았다. 용왕이 일러준 대로 운문면(雲門面)에 이르러 작갑사(鵲岬寺)를 지었다”라고 하였다. 또한, “고려 태조(太祖)가 삼국을 통일하고 보양 법사가 이곳에 절을 짓고 산다는 말을 듣고 다섯 갑(岬)의 밭 500결(結)을 합해서 이 절에 바쳤다. 또 청태(淸泰) 4년 정유(丁酉, 937)에는 절 이름을 운문선사(雲門禪寺)라 내리고, 가사(袈裟)의 신령스러운 음덕(蔭德)을 받들게 했다”는 기록도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려시대 이루어졌던 신인종(神印宗)의 개창과 관련해 두 가지 기록이 공존한다. 그것은 첫째는 개창조를 명랑 법사로 보는 것이고, 둘째는 보양 선사를 개창조로 삼는 것이다. <삼국유사> ‘명랑신인’ 조에는, “우리 태조(太祖)가 나라를 세울 때 또한 해적이 와서 침범하니, 이에 안혜(安惠)ᆞ, 낭융(朗融)의 후예인 광학(廣學)ᆞ, 대연(大緣) 등 두 고승(高僧)을 청해다가 법을 만들어 해적을 물리쳐 진압했으니, 모두 명랑의 계통이었다. … 또 태조가 그들을 위해 현성사(現聖寺)를 세워 한 종파(宗派)의 근본을 삼았다“라고 하였다. 또한 명랑 법사는 “법사 명랑(明朗)이 신라에 태어나서 당나라로 건너가 도를 배우고 돌아오는데, 바다의 용이 청해, 용궁(龍宮)에 들어가 비법(秘法)을 전하고, 황금 1,000냥을 보시받아 자기 집 우물 밑에서 솟아 나왔다. 이에 자기 집을 내놓아 절을 만들고 용왕(龍王)이 보시한 황금으로 탑과 불상(佛像)을 장식하니 유난히 광채가 났다. 그런 때문에 절 이름을 금광사(金光寺)라고 했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신라의 고승들이 용궁에 다녀온 것과 관련해서 명랑 법사와 보양 선사는 유사한 이야기의 전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삼국유사>의 ‘보양이목(寶壤梨木)’ 조에는 보양 법사와 친분이 있었던 비허 선사[備虛師]의 기록이 있다. 같은 조에는, “석굴사(石굴寺)의 비허사(備虛師)와 형제가 되어 봉성(奉聖)․석굴(石굴)․운문(雲門) 등 세 절이 연접된 산봉우리에 늘어서 있었기 때문에 서로 왕래했다”라고 하였다. <삼국유사>의 다른 기록에도 비허 선사는 보양 선사와 친분이 있었으며, 동일하게 왕건을 도왔다.
용연사의 비문에는 보양 선사가 중국에 유학했을 때 지암(智巖 禪師, 600~677) 선사를 만났다는 것인데, 지암 선사는 당 태종 정관 17년(643) 건업 우두산 법융 선사(法融 禪師)를 만나 우두종(牛頭宗)의 2조가 된 인물이며, 이 시기는 명랑 법사의 활동 시기와 비슷하다. 그러나 현실적인 판단은 일연 선사가 <삼국유사>를 기록할 당시, 명랑과 보양 선사를 구분해 명랑을 신인종의 개조로 그 정통성을 두었지만 <조선사찰사료>에 보이는 용연사의 비문은 조선시대 신인종의 개조를 두고 언젠가 명랑 법사와 보양 선사를 혼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