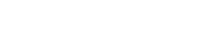밀교로써 평화의 길을 제시했던 마지막 등불-돌제최빠
페이지 정보
호수 307호 발행인 록경(황보상민) 발간일 2025-06-01 신문면수 14면 카테고리 밀교 서브카테고리 불교법장담론페이지 정보
필자명 -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 필자정보 - 리라이터 -페이지 정보
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25-07-07 15:39 조회 1,077회본문
한국에서 천수관음과 육자진언 염송의 발원을 살피려면 동아시아 밀교를 주도했던 고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고려 시대 밀교의 판도가 티베트·몽골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전역에 미치는 사실은 천수관음 신앙과 육자진언의 유행으로 확인된다. 육자진언은 변화관음 가운데 사비관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비관음의 조상은 보로부둘 뿐만 아니라 멀리 태국에서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38950, 8세기 태국) 자세한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테라바다 지역에서 육자진언을 상징하는 밀교의 소상이 발견된 것은 육자진언이 유행한 판도를 넓혀야 할 새로운 과제를 던진다.
사비관음의 경우 네 팔은 자비희사(慈悲喜捨)의 사무량심을 상징한다. 또한 네 손에 들고 있는 지물(持物) 가운데 합장의 무드라에서 양손으로 쥐고 있는 것은 여의보주(如意寶珠)로서, 관세음보살의 반야와 방편의 불이성을 상징한다. 오른손의 수정염주는 염주를 끊임없이 돌릴 수 있는 것처럼 관세음보살의 중생구제 염원이 영원함을 상징하고, 왼손의 연화는 관세음보살의 중생 구제 신변이 무궁무진하면서도 연꽃처럼 무구함을 상징한다.
사비관음의 유행은 최초 『반야경』에서 기원한다. 경전의 핵심 사상은 현상계와 공성, 즉 색과 공의 불이성을 강조하는 것이었고, 이에 대한 삼매야형으로서 방편은 여의보주인 마니, 공성은 연꽃인 빠드마를 소연으로 공과 색, 혹은 반야방편의 불이성을 수행했다고 생각한다. 뒤이어 밀교가 유행하면서 이를 사비관음으로 도상화하고, 뒤이어 세밀한 도상을 그린 탕카의 출현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출처 Wisdom of Compassion: Trí Tuệ Từ Bi))
수많은 과제를 뒤로하고, 근현대의 현실로 뛰어넘으면 동아시아는 일제에 의한 조선의 멸망과 함께 청조로 이끌던 만주, 나아가 티베트, 몽골이 멸절한 불행한 세상이 된다. 청조의 멸망 이후 중국은 국민당과 공산당이 국공의 대전쟁을 벌여 동아시아는 그야말로 처절한 암흑기를 맞이하게 된다.
밀교는 다양한 의식과 의례를 통해 붓다의 자비로 사회를 통합하고 평화로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해왔다. 동아시아의 황제와 왕은 대부분 불교 신자였다. 이들이 불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전쟁과 살육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국가의례의 설행 가운데 권력자들이 들었던 것은 불보살의 불살생과 자비의 법음이었을 것이다.
동아시아의 혼란기에 밀교 의식을 거행하고 세상의 전쟁을 막으려 했던 마지막 아사리를 들라고 하면, 아직 조사되지 않은 많은 인물이 있겠지만, 그중 돌제최빠(1874~ ) 스님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스님은 청조 동치 13년(1874년) 티베트에서 태어나 일찍 출가하여 라싸의 데뿡 사원에서 12년간 현교와 밀교를 공부하고, 최고 승려 학위인 게셰 학위를 받았다. 40세가 되던 1911년 스님은 몽골과 중국을 오가면서 많은 불사와 관정도량을 폈다.
당시 중국인이었던 석대용은 1921년 일본의 고야산에서 동밀을 공부하고 아사리가 되어 중국으로 돌아왔는데, 이때 돌제최빠 스님을 만나 자신의 미진한 공부를 완성하였다. 역사적으로 인도에서 발원한 티베트 밀교와 동아시아 밀교의 유일한 계승자인 고야산의 당밀이 만나는 희귀한 법연이 이때 이루어졌다.
돌제최빠 스님은 당시 중국에 억류되었던 판첸라마 10세를 만났고, 판첸라마의 사원에 머물면서 많은 밀교 경궤를 중국어로 번역하였다. 이때 많은 중국인이 판첸라마와 돌제최빠 스님에게 귀의와 공양을 올렸는데, 그 자원은 당시 중화민국이었던 중국을 비롯해 티베트, 몽골 지역에 불사를 거행하는 것이었다.
돌제최빠 스님은 주로 동부 티베트인 사천 지역에 머물며 법을 폈으며, 밀교의 발원지인 인도를 순례하기도 하였다. 1933년 제13대 달라이 라마가 라싸에서 입적하자 티베트로 돌아와 조문하였고, 이후 데뿡사원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으나, 뒤이은 국공내전과 마오쩌둥에 의한 공산화, 티베트의 침탈이라는 고난의 역사는 그의 말년 기록조차도 알 길이 없게 만들었다.
돌제최빠 아사리에 주목하게 된 것은 그가 남긴 『밀승법해(密乘法海)』라는 책 때문이다. 이 책은 많은 밀교의 진언과 다라니 가운데 현실적으로 긴요한 것을 가려 뽑아 결집한 것인데, 진언을 실담자로 표기하고 티베트·몽골·한문을 병기한 것이어서, 동아시아 밀교 문화 통합의 역사를 담은 상징적인 책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후기 밀교 진언을 포함하지만, 조선 시대에 발간된 『진언집』과 기본적 구조는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다. 육자진언의 유통과 근대 밀교 판도를 오간 것은 거리가 먼 주제 같지만, 육자진언이 가진 밀교 문화의 판도와 동아시아 시대의 마지막에 동아시아에 밀교를 홍포하려 했던 돌제최빠 스님이 교차하는 것은 육자진언의 유통과 과제가 시대적으로 넓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언젠가 인도 밀교와 동아시아 밀교 문화의 교차 연구도 필요한 일이어서 당분간 『밀승법해』와 『진언집』에 나타난 진언을 소개하고 해석하는 일에 지면을 할애할까 생각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