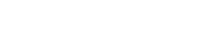줄탁동시啐啄同時
페이지 정보
호수 307호 발행인 록경(황보상민) 발간일 2025-06-01 신문면수 12면 카테고리 신행 서브카테고리 역삼한담페이지 정보
필자명 탁상달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시인 필자정보 - 리라이터 -페이지 정보
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25-07-07 15:37 조회 1,076회본문
어느덧 싱그러운 6월이다. 눈만 뜨면 천지사방에 꽃 아닌 데가 없고, 꽃보다 더 고운 녹음이 눈부실 정도이니 말이다. 해마다 보는 꽃, 늘 보아오던 녹음이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의 역동적 변화 앞에 우리의 가슴이 희망의 떨림으로 부풀어 오른다.
지난 5월은 은혜와 감사의 나날이었다. 그중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었다. 학생을 올곧게 교육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선생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날이기도 했다. 이 땅의 스승들께서는 겸손한 마음을 키워주고,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을 베풀며, 인정 많고 담대하여 때로는 배은망덕(背恩忘德)과 무관심까지도 서운한 내색이 없다.
맹자(孟子)는 군자가 인재를 가르치는 다섯 가지 방법 중 가장 으뜸이 ‘시우지화(時雨之化)’라고 했다. ‘때맞춰 비가 내려야 초목이 쑥쑥 자라듯, 제때 제자가 갈 길을 바로잡아 주어야 바르게 성장한다’는 뜻이다.
스승과 제자의 만남은 이러한 ‘운우(雲雨)와 초목(草木)’ 같은 운명적인 만남이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는 ‘선생은 많지만, 스승은 없다’고들 한다. 그것은 좋은 스승이 적다는 의미보다는, 반대로 좋은 스승이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되지 못함을 개탄하는 이야기에 더 설득력이 있다.
‘스승을 경시하는 스승의 날’이라면 오히려 없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일 것이다. 심지어 어떤 때는 가장 자랑스럽고 축복받아야 할 ‘스승의 날’마저도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아예 휴교한 사례도 있었다. 선생님들이 죄인이 되는 판에 ‘스승의 날’은 해서 무엇하겠느냐는 것이었다.
중국 송(宋)나라 때의 불서(佛書) 『벽암록(碧巖錄)』에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말이 있다. ‘줄(啐)’은 병아리가 알 속에서 쪼는 동작이며, ‘탁(啄)’은 어미 닭이 알 밖에서 도와 깨는 동작을 의미한다. 그리고 ‘동시(同時)’는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 안에서 쪼는 행위[啐]와 어미 닭이 바깥에서 도와주는 행위[啄]가 동시에 일어남을 뜻한다.
‘줄탁동시’는 원래 선불교(禪佛敎)에서 흔히 사용되던 말로,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제자가 깨우칠 때까지 품고 보살피는 스승은 아직 깨치지 못한 제자의 한계가 깨어질 때까지 줄탁(啐啄) 작업을 함께 한다는 의미이다.
교육은 인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는 제자, 그 성장을 더 기뻐하는 스승이 있기에 가능한 상호작용의 결정체이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세계 어느 나라보다 선생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는 선생님 개인에 대한 존경심이기보다는 제자의 미래와 꿈에 대한 경외감(敬畏感)의 한 표현이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병아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 안에서 알을 깨려고 노력할 때[啐], 때맞춰 어미 닭이 밖에서 알을 쪼듯[啄], 스승과 제자가 뜻을 같이할 수 있는 인격적 만남이 되어야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한 사랑의 나눔과 베풂, 격려와 배려의 표본(標本)을 보여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스승님을 더욱 존경하고, 이분들의 깊은 사랑과 뜻을 받들어, 오늘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