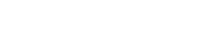준제진언 염송, 고려부터 동아시아에 크게 유행
페이지 정보
호수 303호 발행인 록경(황보상민) 발간일 2025-02-01 신문면수 8면 카테고리 밀교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필자명 정성준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박사 필자정보 - 리라이터 -페이지 정보
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25-02-10 13:42 조회 2,540회본문
준제진언 염송, 고려부터 동아시아에 크게 유행
2. 역사관과 준제진언
1) 『준제경』 유통과 선밀쌍수(禪密雙修)
육자대명왕진언과 함께 『대승장엄보왕경』을 전거로 삼는 또 다른 진언은 바로 준제진언이다. 본경에는 준제진언의 인연에 대해 설하지만, 지바하라역의 『준제경』에 보다 상세한 연기를 설하고, 특히 금강지역과 불공삼장(不空三藏)역의 준제진언은 상세한 염송법을 설한다. 준제진언의 독송은 동아시아에 크게 유행하여 도진의 『현밀원통성불심요집』과 더불어 고려시대부터 유행하였다.
『준제경』은 경흥(憬興)이 찬술한 『삼미륵경소(三彌勒經疏)』와 둔륜(遁倫)의 『유가론기(瑜伽論記)』에 『준제경론(准提經論)』의 인용이 보이고, 조선시대의 경우 『간독(簡牘)』, 몽은(夢隱)의 『밀교개간집(密敎開刊集)』, 용허(聳虛)編의 『조상경(造像經)』에 『준제경』의 언급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도 『준제경(准提經)』의 목판본이 다수 출간되어 조선불교 선밀쌍수(禪密雙修)의 전거가 되기도 한다. 『불조록찬송(佛祖錄贊頌)』 가운데 다음의 글을 볼 수 있다.
曹溪宗師楓巖
諱世察 姓金氏 順天人 康煕二十
七年戊辰十二月十六日生 乾隆三
十二丁亥七月八日寂 壽八十
贊曰
儀狀魁嵬橫鳳目 信衣鉢斧傳應默
猛火聚中不燒珠 準提三昧免山厄
『불조록찬송』 佛祖錄讃頌(ABC, H0305 v12, p.351a16-a22)
조계의 스승 풍암(楓巖)45)은 휘를 세찰(世察)이라 하고 성은 김씨, 순천사람이다. 강희 27년 무진년 12월 16일생으로 건륭 32 정해년 7월 8일 입적하였으니 세수 80이었다. 찬하길 위의는 남달라 봉황의 눈을 하였고 신의(信衣)와 깨침(鈯斧)은 응묵(應默)에게 전했다. 맹화도 사리를 태우지 못했고 준제삼매에 들어 범의 액을 면했다네.
위의 내용은 풍암이 항상 준제삼매(準提三昧)를 닦은 내용을 전하는 것이어서 선사들이 선과 밀교를 함께 닦는 선밀쌍수(禪密雙修)의 예를 보여주는 것으로 준제주가 중요시된 사례를 알 수 있다.
『준제경』은 목판본으로 출간되어 선찰에 널리 유통되었는데 경종 4년(1724) 지리산 화엄사에서 출간된 내용에는 경전을 준제정업(准提淨業)이라 불렀으며 정비된 관행의궤(觀行儀軌)를 갖추어 수행했음을 알 수 있는데, 청련거사(靑蓮居士)의 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정업(淨業)은 보현행원을 닦아 구경에 이름을 말한다. 때문에 이 원으로 관행에 드는 것은 제망(帝網) 무진(無盡)의 묘관(妙觀)이며 현교와 밀교를 모두 포섭하니[顯密雙融], 비로자나가 두루 있는 곳에 아미타불이 나타나니 법신과 보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어서 준제정업은 일찍이 한 사례가 없었으니 어찌 다시 둘이 있겠는가? 현밀의 심요(心要)를 읽으면 그 심오함과 해박함에 감탄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유산 아카이브에서 발췌)
선찰에서 삼신(三身)과 관계된 상용의례에서도 보이지만, 선수행과 더불어 개인의 실참원리로서 비로자나불과 아미타불을 함께 닦은 관행으로 존재한 전거가 『준제경』에 있는 것이다. 원정은 준제진언의 전거에 대해 『대승장엄보왕경』 연구를 최초 전거로 삼았지만 이후 『현밀성불원통심요집』의 의궤를 전거로 새로이 제시했고, 이외 『준제경』을 비롯해 준제진언이 한국밀교사에 깊이 관여한 역사도 파악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준제진언의 인연이 조선시대 선밀쌍수(禪密雙修), 혹은 선밀겸수(禪密兼修)의 근거로서 그 불교사적 위상이 동아시아에 걸쳐 적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