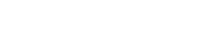항상 자기를 돌아보자
페이지 정보
호수 305호 발행인 록경(황보상민) 발간일 2025-04-01 신문면수 5면 카테고리 설법 서브카테고리 왕생법문페이지 정보
필자명 -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 필자정보 - 리라이터 -페이지 정보
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25-04-15 14:50 조회 1,161회본문
부처님이 성불하신 지 몇 년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부처님의 고향인 카필라의 로히니강이 흐르고 있었고, 강 건너에는 코올리국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코올리야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 역시 석가족의 일족으로서 카필라성의 석가족과 혼인 관계를 맺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부인과 태자 시절의 비인 아쇼다라도 코올리야족이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양쪽 나라를 끼고 있는 로히니강의 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뭄이 계속된 어느 해 여름, 곡식이 타들어 가기 시작하자 양국의 농민들은 강둑에 서서 어떻게 물을 끌어들일까를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코올리족의 한 청년이 소리쳤습니다.
“이 강물을 나라와 함께 사용한다면 두 나라 곡식이 모두 말라죽을 것이다. 물은 우리나라에서만 쓸 테니 모두 이리로 보내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만 물을 쓰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가을이 되어 금은보화를 짊어지고 너희 나라로 가서 곡식을 나눠달라며 사정이라도 하란 말이냐? 어림없다. 강물은 이쪽에서 모두 끌어들여야 해!”
이렇게 서로 물줄기를 자기 나라 쪽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다투었고, 차츰 감정이 격해지자 욕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누이나 동생과 동침하는 카필라 놈들아! 한번 붙어 볼 테냐?”
“대추나무에 둥지를 틀고 사는 코올리 족속들아! 쳐들어올 테면 쳐들어와 보라. 단번에 작살낼 테다.”
마침내 두 나라의 농민은 자기 관리에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대의 허물을 만들어 보고했고, 두 나라 관리는 농민에게 들은 대로 정부에 보고했습니다. 이 사실이 온 나라로 전해지자 석가족은 흥분했습니다.
“누이나 동생과 동침하는 사나이의 주먹맛을 보여주자.” 코올리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추나무에 둥지를 치고 사는 사나이의 힘을 보여주자.” 마침내 두 나라는 전쟁 직전의 험악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카필라 교외에 있는 대림에 머무시다가 이 위기를 관하였습니다. 그리고 홀로 공중을 날아 로히니강의 상공에서 좌선하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두 나라의 왕은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모습을 보자 무기를 버리고 예배했습니다.
“왕이여, 이것은 무엇을 위한 싸움입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럼 누가 알고 있습니까?”
“아마 장군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군도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차례로 물어가다가, 마지막으로 농민에게 물어보니 물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쟁의 원인을 알게 되자 부처님이 물었습니다.
“왕이여, 물과 사람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물보다 사람이 훨씬 중요하지요.”
“그런데 왜 물 때문에 훨씬 중요한 목숨을 버리려 하십니까? 그것도 전투하는 이유조차 모르는 싸움을!”
양국의 왕은 부처님의 이 말씀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만약 부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서로를 죽여 피의 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사소하게 시작된 말 한마디가 능히 피바다 직전의 상태까지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실로 구업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허물을 말하기 전에 자기의 허물부터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항상 자기를 돌아보아야 하는 수행자가 본분을 잊고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어 중상모략한다면 어찌 합당한 일이라 하겠습니까? 수행자가 남을 헐뜯는 것은 도심(道心)을 근원적으로 등지는 행위가 될 뿐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이나 비방을 들을 때, 그 칭찬과 비방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의 허물을 바로 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경전에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 그 어느 것을 들을 지라도 마음의 동요가 없어야 하느니라. 덕이 없으면서 남의 칭찬을 듣는다면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고, 허물이 있어 야단을 듣는다면 참으로 기뻐할 일이다. 기뻐하면 잘못된 점을 찾아 반드시 고칠 수 있게 되고, 부끄러워하면 도를 더욱 부지런히 닦고자 할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좋은 말에나 나쁜 말에나 무심할 수 있고 배워야 한다는 이 가르침은 참으로 뼈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했더라도 욕을 들으면, “이 자식이 욕을 해? 잘 만났다. 오늘 한번 맞아봐라.” 하면서 악을 쓰며 달려듭니다. 아부성 칭찬인 줄 알면서도 자기를 추켜세우면 은근히 좋아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을 긍정할 줄 모르고 칭찬을 좋아하는 밑바닥에는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잘난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요?
넓은 들판에 전나무와 가시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가시나무를 늘 얕잡아보고 있던 전나무가 어느 날 가시나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못생긴 가시나무야, 너는 정말 쓸모가 없는 것 같구나.” 전나무의 말에 가시나무는 시무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가시나무가 전나무에게 물었습니다. “전나무야, 그러면 너는 어떤 쓸모가 있니?” “나만큼 좋은 재목이 어디 있겠어? 마땅히 좋은 집을 지을 때 사용되지.” 전나무는 어깨에 힘을 주며 뽐냈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가 피식 웃으며 점잖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나 나무꾼이 도끼를 들고 이 들판에 오면 그땐 내가 부러워질걸?” 전나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무의 이야기처럼 수행자는 잘 나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못생긴 나무가 되고자 할 때 큰 나무로 자랄 수 있고, 세상의 부질없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도를 잘 닦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칭찬과 비난을 받을 때 감정의 동요가 생겨날 까닭이 없습니다. 잘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한 것도 없이 남의 칭찬을 들을 때 능히 부끄러워할 줄 알고, 허물이 있어서 욕을 들을 때 야단치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흔쾌히 받아들일 줄 압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문제를 없애줍니다. 수행자는 잘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못난 사람이 되고 못난 바보가 되어 살아야 합니다. 못난 바보가 될 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수행의 정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잘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