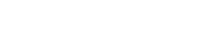“피안과 극락은 자기 마음에 있다”
페이지 정보
호수 305호 발행인 록경(황보상민) 발간일 2025-04-01 신문면수 4면 카테고리 지혜 서브카테고리 함께 읽는 종조법설페이지 정보
필자명 윤금선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작가 필자정보 - 리라이터 -페이지 정보
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25-04-15 14:49 조회 1,184회본문
제1장 교상과 사상 편
제3절 각종 논설
6. 설법의 특질
대기설법(待機說法)=지식계급(知識階級)에는 고매(高邁)한 이론(理論), 하급(下級)에 대(對)해서는 비근(卑近)한 예(例)와 비유(比喩)
상호설법(相好說法)=용모(容貌) 거지(擧止)로서 상대방(相對方)을 위압(威壓)
비유설법(譬喩說法)=육창일원등(六窓一猿等) 비유(譬喩) 추상적(抽象的) 원리(原理)를 구체적(具體的) 비유(比喩)로서 표현(表現)하고 고원(高遠)한 이상(理想)을 안전(眼前)의 사물(事物)에 의탁(依託)하여 상대(相對)의 이해(理解)를 용이(容易)하게 하는 설법(說法)이다.
인연설법(因緣說法)=현재(現在)의 사실(事實)에 대(對)하여 그 유래(由來)한 본원(本源)을 설(說)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연(因緣)담은 상대(相對)로 하여금 자신(自身)의 현실적(現實的) 반성(反省)을 강조(强調)하여 과거(過去)를 회고(回顧)함과 동시(同時)에 장래(將來) 선과(善果)를 이루도록 격려(激勵)함으로써 그 생활(生活)을 청정(淸淨)케 하는데 목적(目的)이 있다.
문답법(問答法)=주(主)로 이학외도(異學外道)에 대(對)하여 편견사념(偏見邪念)을 전환(轉換)케 하는 방편(方便)으로 사용(使用)한다. 세존(世尊)은 상대(相對)의 질문(質問) 형식(形式) 여하(如何)에 따라 그 답변(答辯)의 방법(方法)을 달리 하였는데 네 가지로 분류(分類)된다.
그 첫째는 일향기(一向機)로서 상대(相對)의 질문(質問)이 적절(適切)할 때는 그대로 긍정(肯定)하는 것이요,
그 둘째는 분별기(分別機)로서 질문(質問)이 이치(理致)에 적합(適合)한가 아닌가를 먼저 분별(分別)하고 가부(可否)를 대답(對答)하는 것이요,
그 셋째는 반힐기(反詰機)로서 질문(質問)에 즉시(卽時) 답(答)하지 않고 오히려 반문(反問)과 힐문(詰問)을 통(通)하여 상대(相大)의 오류(誤謬)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요,
그 넷째는 사치기(捨置機)로서 질문(質問)이 이치(理致)에 합당(合當)치 않고 아무런 소용(所用)도 없는 경우(境遇) 아무런 회답(回答)도 하지 않고 침묵(沈默)하여 내버려 두는 것이다.
전의법(轉意法)=상대(相對)의 논설(論說)을 처음부터 부정(否定)하지 않고 그 형식(形式)을 긍정(肯定)하면서도 교묘(巧妙)하게 그 내용(內容)을 전환(轉換)하여 새로운 의의(意義)를 부여(賦與)하는 방법(方法)이다. 바라문(婆羅門)의 이상(理想)은 생천(生天)인데 세존(世尊)은 이러한 생천설(生天說)을 직접(直接) 부정(否定)하지 않고 생천(生天)하기 위(爲)하여는 자비희사(慈悲喜捨)의 사무량(四無量)을 닦아야 한다고 설유(說諭)함과 같은 것은 그 좋은 예이다.
몇 년 전, 미네소타주립대학에서 10년 넘게 불교철학을 강의하고 있는 홍창성 교수를 방송에 모신 적이 있다. 불교를 전혀 모르는 미국의 대학생과 유학생에게 끊임없이 문답을 주고받으며 그들의 언어와 사고체계에 맞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자 정성을 기울여온 모습에 감명받은 기억이 있다. 그들은 강의나 글에서 이해되지 않는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강사나 저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해와 설득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의견을 들어 충분히 납득할 때까지 답을 요구한다고 한다. 우리는 그럴 때, 이 정도도 이해하지 못하나 싶어 부끄러워하며 침묵하기 쉬운데 강의를 하거나 글을 쓰는 이가 상대를 이해시키는 것이 의무라는 이야기에 놀랐다.
어줍잖지만 글 쓰는 일을 하면서 나름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짧고 쉽게, 그리고 경험에 비추어 솔직하게 쓰겠다는 것이다. 어려운 글은 읽는 것부터 재미가 없다. 불교 용어는 개념을 파악하는 단계에서부터 헤매기 일쑤이니 될 수 있으면 어려운 단어는 피하고, 반드시 써야 하는 단어라면 쉽게 풀어쓰려 노력한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 용어 몇 개 바꾼다고 내용이 알찬 건 아니다. 아는 척 해봐야 감출 수도 없다. 많이 알고 깊이 알아야 글이 쉬워진다. 제대로 알고 충분히 체화해야 나올 수 있는 단어와 표현이 있다. 자신의 경험과 사유를 거쳐 내면에서 소화되고 걸러져야 쉽고 구체적인 언어가 나오는 법이다. 지식이 얕고 수행력과 지혜도 턱없이 부족한 까닭에 말이며 글에 향기가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어쩌랴. 수준과 깊이와 노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인정한다. 다만 내가 알고 있고, 느끼고 있으며, 감명받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인류 최고의 의사라고 이야기한다. 마음의 병을 고치는 최고의 의사이고, 상담가이며, 마음 치유자라고 표현한다. 육체의 병을 고치는 의사는 약과 주사와 메스로 병을 치료하지만, 마음의 병을 고치는 의사는 말로써 치유한다. 그런데 말이란, 나오는 그대로 상대의 병을 고치지 못한다. 병을 앓고 있는 본인이 받아들여야 하고, 그 마음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바꿔야 한다. 마음 먹고 마음 쓰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 육체의 병을 극복하는 데에도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마음의 병은 거의 전적으로 본인의 의지와 노력에 달렸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말에 정성을 기울이신 것이 아닐까?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상대의 수준과 관심에 맞춰 말씀하셨다. 그것이 대기설법, 비유설법, 인연설법 등이다. 찾아오고 물어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민과 상황에 맞추어 이렇게도 예를 들고 저렇게도 비유하여 친절하게 설명했다. 그것이 팔만사천의 방대한 가르침이 되었다. 그리고 말 이전에, 빛나는 위의와 상호로 만나는 것만으로도 감화를 주셨다. 부러 그런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했다기보다는 생활이 곧 삼매이고 일상이 곧 깨달음이었기에 지혜와 자비가 흘러넘쳤으리라.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 그 전에 함께 고행했던 다섯 수행자를 찾아갔을 때 그들은 고행을 저버린 타락한 수행자라며 아는 척도 하지 말자고 했다. 하지만 멀리서 다가오는 부처님을 뵙자마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약속이나 한 듯이 일어나 맞이하고 자리를 치워 모시며 가르침을 청했다.
불교방송국 17층 복도 끝에는 방송 출연을 위해 오신 분들이 잠시 대기할 수 있는 자그마한 테이블이 두 개 놓여있다. 어느 날 녹음을 하려고 올라갔는데 멀리서 비구니 스님의 뒷모습이 보였다. 너무나 작고 평범하다 못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한 스님의 뒷모습에 자비의 온기와 지혜의 광채가 은은하게 번지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머리와 가슴과 온몸에 광배가 솟구치고 수행정진력이 높은 큰스님들께서 빛을 뿜었다고 하더니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방송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자주 뵌다. 얼굴이 너무 맑고 투명해, 잘생긴 배우나 포스 있는 저명인사들이 내뿜는 아우라와는 결이 다른 수행자의 모습을 만나곤 한다. 번뇌와 욕심이 적으면 얼굴 자체에서 빛이 난다는 것을 알게 하고, 사유와 수행의 시간이 자비와 평화로 이어져 몸짓 자체가 고요하고 안온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이 시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불교 수행자라면 달라이 라마 존자와, 얼마 전 원적에 드신 틱낫한 스님을 꼽는다. 두 분의 글을 읽으면 어려운 말이 별로 없다. 달라이 라마 존자는 ‘친절’과 ‘용서’라는 말이, 틱낫한 스님은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라는 말이 떠오른다. 그것이 곧 불교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게 한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기에 그대로 살아있는 법문이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처음으로 가르침을 들은 60여 명의 제자에게 이렇게 선언하셨다. “수행자들이여,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안락을 주기 위해 떠나라. 유행할 때는 많은 사람을 위해 애민하여 섭수하고자 법을 전하되, 처음과 중간과 끝을 모두 올바르게 설하여 의미가 분명하고 어구가 명료해 의심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수행자는 항상 원만구족하고 청정한 범행을 보여주어야 한다.” 말과 행동과 마음이 순일하고 한결같은 바탕 위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라는 전도 선언을, 우리 불자도 따르고 노력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어쩌면 말이 아니라 실천이 부족한 것일지도 모른다. 배운 만큼, 아는 만큼, 느낀 만큼 실천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벌써 부처가 되었을 것이고 이 세상은 불국정토가 되었을 것이다. 실천만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기도로, 설법으로, 봉사로, 그리고 미소와 친절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