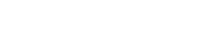풍류도와 밀교사상
페이지 정보
호수 310호 발행인 록경(황보상민) 발간일 2025-09-01 신문면수 11면 카테고리 밀교 서브카테고리 밀교법장담론페이지 정보
필자명 정성준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자유기고가 필자정보 - 리라이터 -페이지 정보
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25-09-16 14:48 조회 689회본문
삼재는 새롭게 봐야 할 한민족의 인간 가치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그 기록 대부분은 <삼국유사> 기록이나 <위서> 같은 중국의 기록에서 자취를 파악하고 있다. 한국에 고조선을 비롯한 상고의 시대가 있지만 이에 대한 기록이 전무한 이유는 조선이 명나라를 사대하면서 정부에서 상고사 문건을 의도적으로 불태운 것에서 비롯된다. 특히 세조는 왕위를 찬탈했기 때문에 명나라에 인정받기 위해 수차례 어명을 내려 치밀하게 상고사의 흔적을 지웠다.
현대 사학자들이 요하 지역의 무덤을 발굴하면서 끊임없이 출토되는 부장물과 무덤 주인공의 유전자 지도는 이들의 주인공이 동이족이며, 이들 문명을 아시아 문명의 발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점점 유력해지고 있다. 한국의 사학자 사이에서는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이지만, 갑골문과 유전자 분석을 더한 체계적 연구는 동아시아를 실질적으로 지배해 왔던 동이족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불교와 밀교를 깔아놓은 지면에서 뜬금없이 동이족과 상고사를 들추는 것은 동이족의 문화와 한국불교 문화 형성에 적지 않은 간섭 현상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 한 예로 신라 시대 유행했던 풍류도의 근간으로 천인지 삼재(三才) 사상이 있으며, 이것은 신라 화랑도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무덤이나 백제의 향로에서 보이듯 동이족이 공유했던 보편적 민족사상이다. 삼재 사상의 다른 기원은 동이족 무덤에서 발견되는 갑골문이다. 갑골문을 연구한 학자들은 갑골문이 하늘의 뜻을 읽기 위한 점사의 기능에서 출발했으며, 동이족의 왕들이 점복을 통해 하늘의 뜻을 묻고 인간과 대지의 일을 결정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동이족은 하늘·인간·땅의 유기적 관계를 중시했으며, 불교가 들어왔을 때 삼국은 삼재 사상과 불교의 융합이라는 동일한 현상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삼국유사>에는 신라와 불교의 오랜 인연을 보여주는 불국(佛國)사상과 땅에서 솟아난 사방불(四方佛)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달달박박과 노힐부득의 경우는 산 채로 성불하여 정토에 왕생했는데, 신라인이 살아서 왕생하는 현실적 왕생을 선택한 것은 전통적 삼재 사상이 불교 신앙의 틀 속에서 해석된 중첩 관계를 보여 주는 것이다. 신라 사회를 통해 구현된 삼재 사상의 다른 발현은 풍류도이다. 풍류는 하늘이라는 무형의 가치와 대지라는 유형의 가치를 인간의 정신과 육신에서 실현하려는 사유체계이다. 풍류는 전통사상과 불교가 결합해 현실의 정토, 혹은 불국으로서 국가와 인간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선밀쌍수를 기고해 오면서 선불교가 지닌 진정한 가치가 무위진인의 틀 속에서 깨어있는 인간 실존의 구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분별과 무명으로 진실과 거리를 둔 미혹을 끊고, 진리가 서 있는 인간을 직시하는 것이 선과 활인검의 본면목이다. 인간이 죽은 자리에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선과 밀교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 인간 실존의 진리를 지적한 것이 바로 즉신성불이고 만다라이고 다라니이다. 다라니는 선문의 수행을 돕기 위해 장애를 제거하는 정도의 부수적 교재가 아니라, 활인검의 날을 더 날카롭게 활용할 제불의 방편이다. 선과 밀교, 삼재 사상은 한민족 고유의 혈통에서 새롭게 보아야 할 인간 가치이다. 하늘의 무형과 대지의 유형, 그리고 인간의 중도실상의 깨달음을 보아야 한다.
한국 선맥의 큰 스승인 서산대사 청허 휴정(淸虛休靜, 1520~1604)은 남원 땅을 지나다가 닭이 홰를 치며 길게 우짖는 소리를 듣고서 대오하였다. 청허 휴정은 <삼가귀감(三家龜鑑)>을 남겼다. 상중하 세 권으로 구성된 책은 제목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유교와 도교와 불교로 구분하여 각각의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형식이다. 불교 편이 <선가귀감(禪家龜鑑)>에 해당한다. 나머지 <장자> 및 <도덕경>의 내용에 유교를 덧붙여 삼교를 회통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청허 유정은 삼재에 기반을 둔 선 철학을 <선가귀감>을 비롯한 문집에서 보여준다.
유무 중도의 인간 실존을 성철 스님은 중도상(中道床)이라 하였다. 성철 스님은 평생 아비라기도를 권장하였다. 아비라기도는 밀교수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로자나여래의 법신을 수행자와 동일시하는 밀교 수행이다. 성급히 말하면 인간의 실존을 분별심으로부터 구해 하늘, 대지의 현실과 연기하는 인간 행복의 실천 원리가 선과 밀교, 삼재 사상을 관통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삼재 사상의 원형을 요하 문명과 동이족의 시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고조선 이후 민족정신에서 그 본류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하늘에 지낸 제사를 유형의 제단과 의식으로 실체화한 이력이 선덕여왕 시대 사천왕사의 문두루법을 가깝게 만든 요인이라 생각한다. 비전공자로서 풍류도와 연계해 삼재 사상을 약간 들여다본 것만 가지고 소개한 것은 추천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동이족 고조선이 남긴 하늘과 의례의 종교문화는 <삼국유사>에서 보이듯 불교와 의례, 선으로 전개되어 고려 시대 동아시아 밀교 대국으로 거듭나는 동기가 되었다. 민족 정체성을 정의하는 또 다른 축에 밀교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후학에 의해 이루어지길 바란다.

<사진> 청허 휴정(淸虛 休淨, 1520~1604)의 진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신수15480. 공공누리 저작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